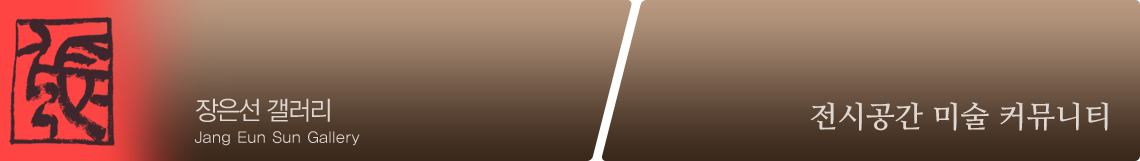게시판
- 제목
-
김성민 초대展
- 작성일
- 2008.10.09
- 첨부파일0
- 조회수
- 1668
둥그스름한 것, 뚱뚱한 것, 갸름한 것. 몸통은 뚱뚱한데 목은 가늘고 긴 데다가 휘어진 것, 몸통도 목도 뚱뚱한 것. 어른들은 김성민의 작품 앞에서 다양한 몸통을 가진 도자기를 만나게 된다. 이게 뭘까. 어른들은 설명해주지 않으면 보아뱀이 코끼리 먹은 그림을 모두들 ‘모자’라고만 생각한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순수한 어린 왕자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피상적인 것만 보려고 한다.
김성민은 말했다, 도자기는 자기 자신이며 ‘내 마음’이라고. 물레 위에서 흙을 빚는 작가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흙과 불과 혼의 예술의 결정체인 도자기는 ‘나’라는 존재를 의인화한 것이라고 했다.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처럼 갇혀 있으나 목을 세우고 어디로든 뻗어 나가려는 모양, 이리 저리 휘어지면서 답답한 마음이 고개를 돌리고 어디론가 다른 곳을 향해 바라보기도 해 보는 도자기들은 작가의 ‘내 마음’이기도 하지만 모든 ‘마음’을 가진 존재들을 상징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빈 공간이기에 무엇이든 채울 수 있어도 언제나 비어 있는, 견고한 껍데기에 둘러 싸여 있는 도,자,기
김성민의 도자기는 그 자신이며 우리 모두이며 또한 어머니의 넉넉하고 아름다운 품 속이다. 그 안에서 편히 쉬고 슬퍼하고 그리워하기도 하며 행복에 젖기도 한다. 악귀를 쫓는 신성한 과일인 복숭아처럼 모성은 자신의 몸통을 하나의 부적으로 형상화시킨다. 잡귀로부터 아이를 지키려 아기의 돌날에 복숭아 모양의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담을 듯 넉넉하게 비워두었으나 나쁜 것은 들어오지 않고 좋은 복만을 담아 주려는 기원인 것이다.
작가가 말했듯, 그가 표현해 낸 도자기는 작가 자신이다. 예술가는 모든 이들을 품는 그릇이니 그 자신이 그릇이 되었다. 쉬어가는 곳, 작가의 마음이다. 거울을 보는 여인의 마음처럼 어느 날은 뚱뚱하게도 또 어느 날엔가는 목이 길어 슬퍼지기도 하는 여인의 마음이다. 스쳐 지나가는 순간의 소중함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봄날 같던 꽃과 나비, 따각따각 거리며 지나쳐 가는 말발굽소리처럼 지나간 날들의 소중함을 담고 있는 마음이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